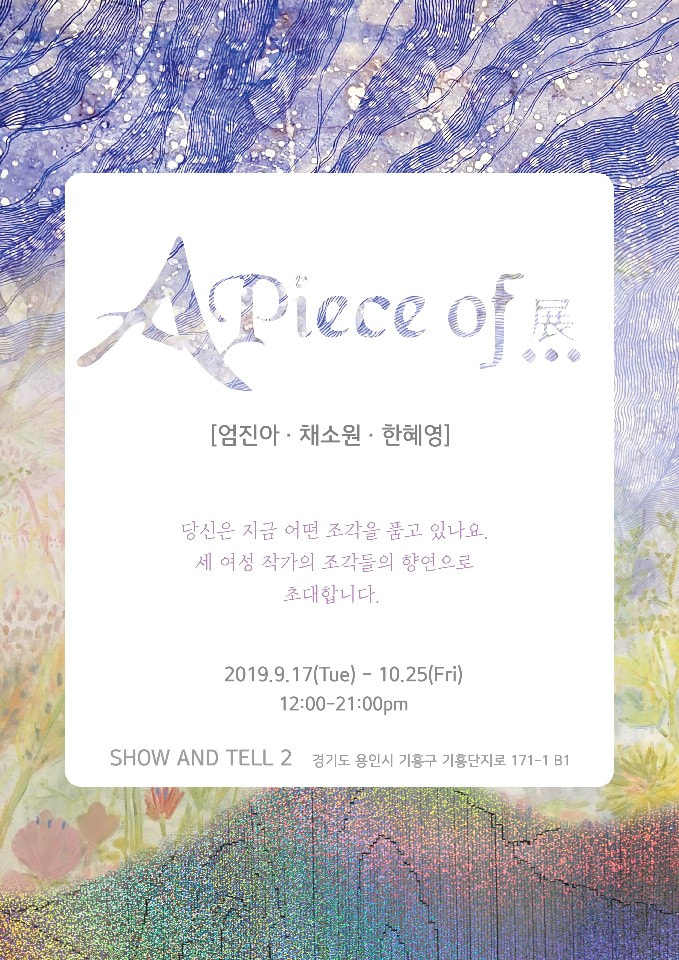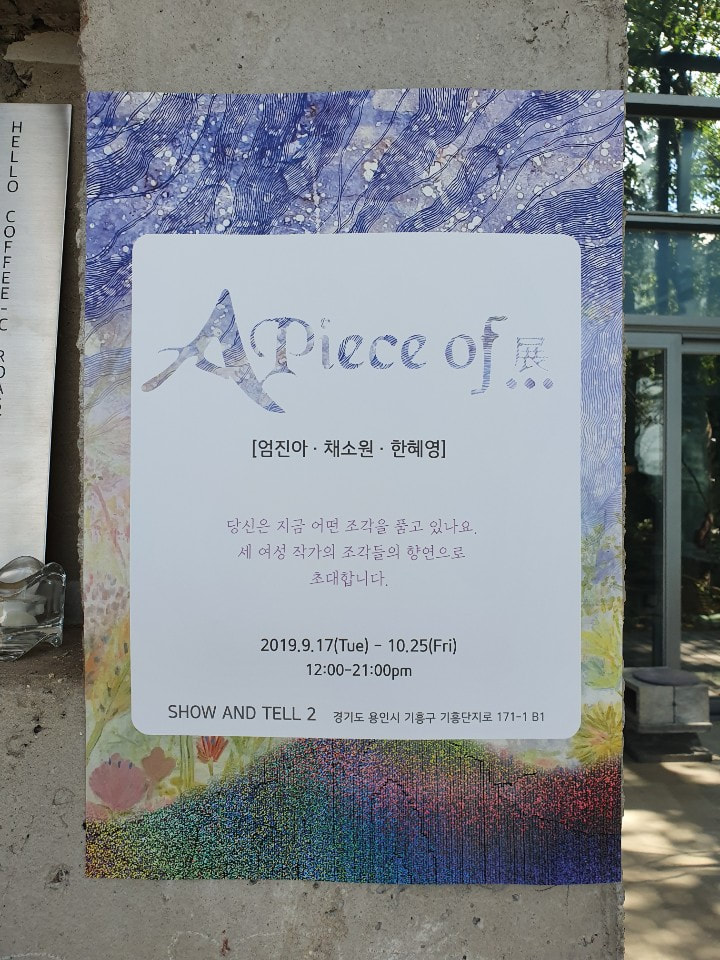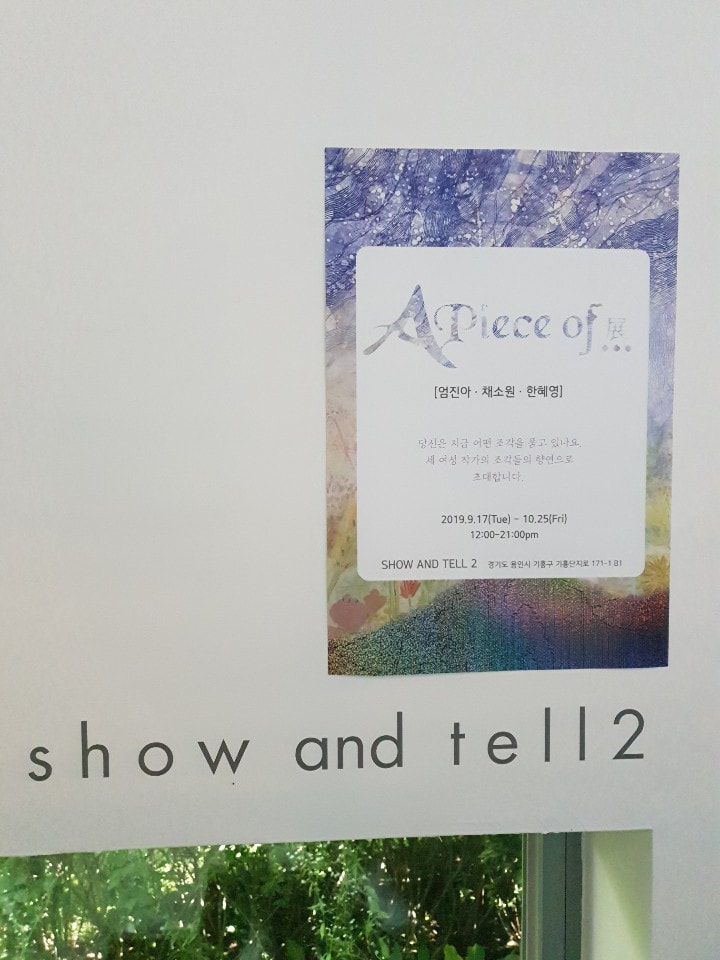Jina+Sowon+Haeyoung have come!
SHOW
|
어리숙하지만 당차고 아름다웠던 20대. 자신들의 작업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자신에 대해 성찰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흐름을 타고 청춘의 길로 빛처럼 달려갔다. 달리고 달려도 삶은 나의 의지와 때론 무관하게 흐르고, 나로 시작한 삶은 누군가에게 불리는 누군가의 ‘나’ 가 되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세상 속으로 점점 묻혀, 내가 누구인지 정처 없이 함께 흐른지… 15년.. 16년… 내가 나를 본다… 거울 속에 문득 낯선 누군지 모를 내가 서있다. 그리곤 이제서야 내 안의 나에게 말을 건넨다. “나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 끊임없는 물음 속에 붙잡지 못한 시간, 흘려보낸 많은 마음들을 그리며, 당신 삶 속의 나에게 물음을 던져본다. 오로지 나였던, 본연 그대로의 자신을 살며시 꺼내어 보며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 그녀들은 당신들도 우리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나요? 하고 던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안의 나를 다시금 찾아보라며. 당신 안의 어른 아이가 애타게 당신을 부르고 있다면서. 그렇게 이번 전시를 통해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나가며 나를 다시금 끌어안고 보듬으며 본연의 나를 찾음과 동시에 숱한 이야기를 한 땀씩 풀어 놓는다. TELL |
|
A Piece of ….
이번 전시는 “A Piece of ….”를 주제로 세 여성작가의 각기 다른 삶의 영상을 재조명한다. 엄진아 작가는 인연이라는 모든 만물을 통해 엮어지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실 속의 안일함에 점점 빛 바래져 가며 그 수많은 감정 속의 나를 끌어안지 못하고 방황한다. 그래서 나는 알고 싶었다. 과연 마음이란 것은 심장 안 그 어느 곳에서 그토록 알 수 없는 나를 흔드는지 말이다. “ -작가노트..- 관계의 조각들은 마치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그 어지러운 이야기 속에 어떤 단어로도 써 내려갈 수 없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즐비한다. 뒤집고 흔들어도 알 수 없는 곳에 숨어든 기억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장 어두운 밑바닥의 상처에서부터 조용히 흔들리는 수면 같은 절정의 기쁨을 어루만지며, 버리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한 미련과 흔적이 작가의 내적 공간 안에 흐트러진 채 남아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이렇듯 작가에게 있어 모든 인연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본인에게 떼어낼 수 없이 모든 자극을 생성하며 종이 위로 스미게 한다.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오는 내적 공간 속 수많은 일렁임들을 '선'이라는 매개체로 표현하며 본인의 감정을 해독한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그때 나는 당신과의 이야기가 있었음을, 나는 그러했음을. 채소원 작가는 본질적인 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과연 나는 무엇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은 작가의 삶 속에서 출발 된다. 안정적이면서도 늘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변화무쌍한 감정 속에 스스로를 던지며, 자신에 대해 더욱 진취적으로 끊임없이 묻는다. 이에 작가 자신을 ‘선’으로 표상화시켜 반드시 어딘가와 이어진 수많은 자신의 모습을 홀로그램이라는 장르를 통하여 표현한다. 캔버스 위에서 빛을 내뿜는 수많은 홀로그램은 자신의 내면화된 직접적인 ‘자아’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작가는 결국 말한다. 스스로도, 그 어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수많은 조각에 대해 규정화할 수 없는 본인 자신을. 한혜영 작가는 본인의 조각들을 기억이라는 공간을 통해 재구성한다. 시간의 흐름에 물 흐르듯 떠밀려 지난 모든 시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미다 못해 언제부터인가 점차 흐려져 간다. 내가 흐르는 것인지, 그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 자신도 모르게 지나쳐 왔던 시간들에 ‘추억’이라는 공간을 잠시 꺼내어 보았다. 그 속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마냥 행복해했던잠시 잃어버린 내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보듬어 주지 못하고 제대로 마주하지 못해 여태 자신을 바느질하며 꿰매기만 했던 지금의 내가 서 있다. 작가는 다시금 자신을 마주하며 추억 속에 ‘나’를 던져 본다. 무심하게 피고 지는 들풀들이 존재 자체로 아름답듯이, 어린 시절의 본인을 상기시키며 그렇게 무심히 내 안으로의 여행을 떠난다. 그렇게 작품 속에 기억 속의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하며 작업을 통해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나간다. A Piece of..."는 세 여성 작가의 각기 다른 조각의 이야기들로 본인의 치유의 방법이자 또한 그들 자신이라 할 수 있다. 종이라는 화면 위 그 안에 스쳐가던 수많은 기억들이 즐비하고, 바라보던 나 자신이 스며들어 있다. 그림을 통해 본인의 감정을 해독하며 끊임없는 이야기로 '나'를 말하고, 누군가 들어주지 않아도 하게 되는 혼잣말처럼 작은 종이 앞에서 흩어진 파편의 기억을 더듬으며 나라는 존재를 다시한번 드리운다. 그렇게 세 여성작가는 자신들이 당면했던 인생과 집념, 당신들과의 인연을 다시금 종이 위에서 거듭 매만지며, 내적 공간 속 그 심연 안의 가라 앉아있던 보듬지 못했던 조각들을 작품으로 어루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