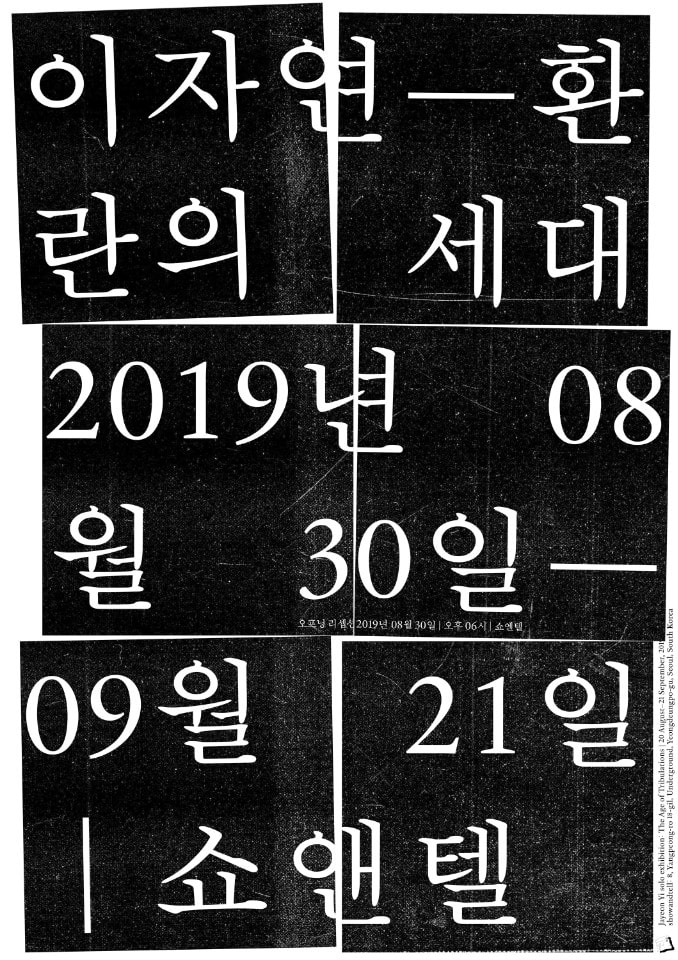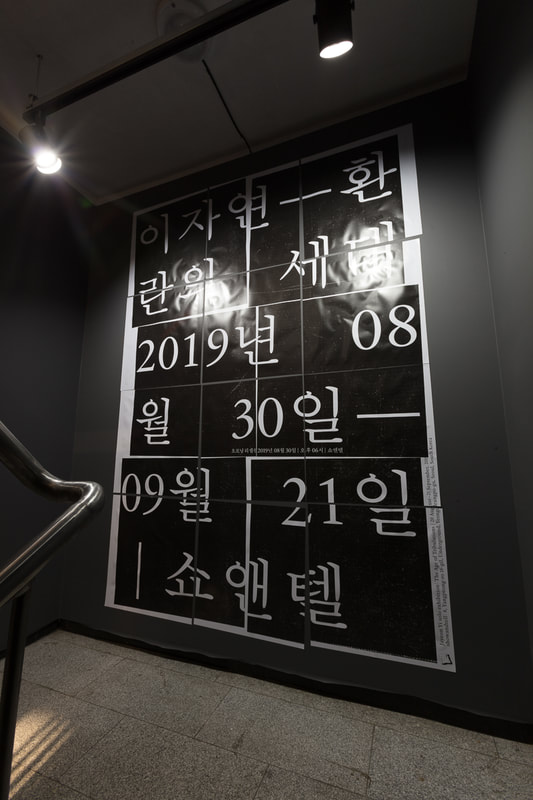Jayeon has come!
SHOW
전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재난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진_ 정지필
TELL
전시 제목인 '환란의 세대' 는 이랑의 노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대중적으로 대상화 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미술가의 언어로 재현하면서 영화의 시각적인 부분을 차용했고 그러면서 영화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과 저의 페인팅 방식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8년부터 영화이미지를 사용하여 ‘2012’ 에서 우박과 해일을 ‘The Day After Tomorrow’ 에서는 폭설 상황, ‘Volcano' 에서는 화산을 ‘San Andreas’ 에서는 지진을, 이 밖에도 ‘Skyline’, ‘This Is the End’, ‘War of the Worlds’, ‘World Invasion: Battle Los Angeles’, ‘The Core’ 등에서 비, 토네이도, 쓰나미, 운석, 우주인 침략, 우주폭풍 등 다양한 각종 재난 in Los Angeles를 재해석 해왔습니다. 재난에 대한 공포증과 불안에 대한 뉴스가 이렇다 할 결과 도출 없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고 있는 것처럼 Los Angeles가 재난의 상징으로서 재현되며 복제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저의 작업이 어떤식으로 해석될수있을까요?
작가노트_이자연
사진_정지필
사진_남윤아
환란의 세대 | ‘그것’을 볼거리로 만들기
1
화면은 혼란스럽다. 거대한 폭발, 자욱한 연기, 눈보라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부서진 자동차와 무너진 건물이 남긴 잔해들 사이로 피난하는 이들이 어지러이 오간다. 조각난 캔버스 위로는 갈피를 잃은 물감 자국이 망연자실하게 흘러내리는데, 이 이미지의 파편들은 극도로 우글거리며 시각적 혼란을 더한다. 하지만 이상하고 자연스럽다. 낯설지만 어렵지 않은 풍경이다. 이 황망하고 어지러운 세계는 철저히 멸망하는 방식으로만 운동하는데, 왜 작가는 자주 여기에 사로잡힌다고 말하는 걸까.
2
재난의 이미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분명 이상 징후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풍요와 안정, 행복을 간구하기 마련인데, 감소하는 엔트로피의 세계에 눈을 돌린다니. 더구나 작가가 사용하는 멸망과 재난의 이미지는 대부분 할리우드 영화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세트장에서 가져온 것이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현실이 아니라 현실인 듯한 무엇이다. 보도 이미지나 다큐멘터리 이미지와는 다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작가가 구현한 가상의 이미지들은 모두의 즐거움을 위해 순전한 ‘볼거리’로 재구성된 재난이다. 이 이미지들은 실감나게 재난을 표현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자동차를 충돌시키고, 폭우가 쏟아지게 하며, 깊은 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건물 위로 미사일을 날린다.
사실 재난을 굉장한 볼거리로 재구성하는 일에는 관객들도 가담한다. 특히 영화관을 찾는 이들은 최대한 실감나게 그 볼거리의 이미지를 즐기기 위해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우스꽝스러운 3D안경을 쓴 채 쏟아지는 비바람을 맞는다. 일부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최고의 스피커와 화면을 제공하는 상영관을 찾기도 한다. 그러는 동안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을 한다. 이 볼거리의 재난 이미지들이 재난 상황을 야기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분노를 잊게 만든다고. 실재하는 재난의 고통을 뒤로 물러나게 하며, 대중을 현혹하여 현실의 쟁점에 눈을 감게 만든다고. 많은 이들이 다치고, 죽고 마는 재난을 윤색하여 심미화할 뿐이라고.
스펙터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볼거리’로서의 재난 이미지가 그 가상 이미지의 생산을 지원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야합하여 그 시스템의 보존에 가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재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재난의 관람자가 아니라, 재난의 당사자라서 이미 그것에 충분히 몰입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재난의 관람객-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작가와 관객이 왜 자주 처절한 재난의 이미지에 이끌리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3
트라우마로 가득한 한국사회에서는 늘 재난을 다루는 데 조심스럽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던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재난의 경험이 그 어떠한 매체로도 온전히 전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처연하고 정직한 인정인 동시에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섣불리 대상화해서도 안 된다는 윤리적 요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고통과 무게로 인해 누구도 재난을 함부로 설명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일상적으로 재난상황을 알리는 서울역의 커다란 뉴스 전광판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이 자꾸 멍해지는 상황인 것이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재난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물을 수밖에 없다. 가수 이랑이 노래 <환란의 세대> 가사에서 말하듯 누군가는 이 어찌할 수 없음 때문에 손목을 긋고 입에 약을 털어 넣는다. 이 재난의 당사자들에게 그것을 겪어내는 이런저런 방법과 재난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권유하는 일은, 이미 재난이 고갈시키고 소모한 그들을 다시금 완전히 소진시키는 일이다. 귀담아들음직한 충고라고 느껴짐에도 그가 이미 겪고 있는 극심한 재난 때문에 당사자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이상한 형국인 셈이다. 우리는 얼마나 더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굳이 살아가야 하는가.
4
이쯤에서 작가는 이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재난을 차라리 만만한 볼거리로 만들어 보자고. 재난은 이미 충분히 우리를 고갈시켰고, 사는 것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하지 않냐고. 우리는 이미 재난에 몰입해있고, 재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자연의 이 이상한 이미지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마도 볼거리로서의 재난에 자꾸 이끌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 장소-환란의 세대-를 겸허한 태도로 극복하라는 위대한 주문들은 이제 조금씩 버겁다.
그것을 볼거리를 바라보듯 구경하면서, 가벼이 지나치듯 살아낼 수는 없을까. 이자연의 이미지는 마치 스펙터클 영화처럼 이 재난 속에서 그저 무수한 볼거리를 남기는 데 몰두한다. 꼭 극복하지 않아도, 해결하지 않아도, 이랑의 노래 가사처럼,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선수쳐버리자”고 말하면서 이 시간을 살아내는 이미지다. 덕분에 재앙과 멸망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다시금 이랑의 노래에서 한 대목을 떠올린다. “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너무 좋다. 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깔끔하다”. 가끔은 이렇게도 느낄 수 있어야 그 다음을 살아갈 힘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자연의 작품은 재난 앞에서 한껏 소진된 인간이 감히 그럴 수 있도록 한다.
_이주연